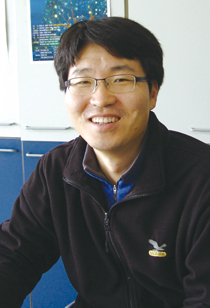
인천녹색연합 장정구(37) 사무처장은 인천 만큼 환경현안이 산족한 곳이 또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경제위기에 맞물려 경기부양이 더해가며 계양산 골프장, 경인운하, 송도갯벌 매립, 강화조력발전소 등을 비롯해 각종 도시재개발사업 등 그야말로 인천은 환경문제의 백화점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지난 2003년 인천녹색연합 회원에 가입했던 장 사무처장은 이번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 2005년 생태도시부장으로 전업활동가를 시작한 그는 생태도시·연안보전 총괄국장을 역임하고 최근 사무처장에 올랐다.
유종반 현 대표나 한승우 전 사무처장 등 쟁쟁한 환경전문가의 뒤를 이었다. 이젠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계에도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무루 익었다고 한다.
강원도 인제 출신이 인천과 처음 연을 맺은 때는 지난 1991년. 춘천 봉의고등학교를 졸업한 장 처장이 서울대학교(응용곤충전공)에 입학, 부평에 있는 형님 집에서 통학을 했다.
“강원도엔 산이 많은 곳으로 공기도 좋았고, 그만큼 사람 인심도 좋았던 곳이다”며 인천은 이와 정반대였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하철1호선 공사는 물론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만 나는 아파트로 인해 숨이 막혔다고 한다.
인천이 공장과 아파트의 도시로 각인됐다는 그는 “공장이 떠나간 자리는 여지없이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아파트가 길로 쏫아지거나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왜 인천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장 처장은 도시민의 삶이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인적으로 자전거에 관심이 많았고, 인천녹색연합에 소모임을 만들면서 활동가로 변모했다. 명문대를 졸업한 그가 잘나가던 입시학원 원장직을 버린 이유다.
장 처장은 인천이 개발열풍이 불면서 환경단체가 마냥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때가 힘들다고 한다. 주민들과 눈 높이를 맞추며 대화나 토론을 하고 싶지만 색안경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개발에 관련한 용어에 친숙해지면서 개발전문가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개발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개발이익은 투기세력의 전유물일 뿐 결코 주민들을 위한 황금방망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가정을 꾸린 장 처장은 이제 인천이 제2의 고향이 됐다. 현안이 많은 만큼 해야할 일도 늘었고, 변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